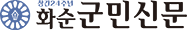- (재)화순장학회, 역대 최대 장학금(12억 원) 1,811명 지원
- 화순전남대병원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 구복규 화순군수, 학부모와 함께 교육 현안 소통
- 화순군, 「2026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 개최
- 화순군, 디지털 실무 인재 양성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 화순군,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 … 120억 원 확보
- 화순군, 2026년 전통시장 환경 대대적 개선
- 2025 제3차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 “기후 위기 대응” 임지락 전남도의원 환경산림대상 수상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남도지사 공식 출마 선언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노 천 명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 지붕에 박 넝쿨 올리고
삼밭엔 오이랑 호박을 놓고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마당엔 하늘을 욕심껏 들여놓고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부엉이가 우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놋양푼의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우 나는 산골 애기를 하면
삽살개는 달을 짖고
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지천명에 접어든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이런 꿈을 꾸어보지 않을까?
큰 걸 바라지 않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생활.
기자도 젊은시절엔 도시를 동경하며 문명이 발달한 곳만 찾아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엘 간다해도 하루 머물기가 싫어진다.
화순을 좋아하는 탓도 있지만 아마도 내마음은 아직도 더욱 오지(奧地)를 찾는 거 같다.
은둔자의 삶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라는 생각...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간 노천명 시인을 오늘 문득 기억해 내본다.
노천명(盧天命 1911~1957)
1911년 9월 1일 황해도 장연군 전택면(專澤面) 비석리(碑石里) 출생으로, 본관은 풍천(豊川), 아명(兒名)은 기선(基善), 천주교 영세명은 베로니카(Veronica)이다.
1930년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과에 입학해 1934년 3월 졸업했다.
보통학교 5학년 때부터 잡지 『동명(東明)』과 『동아일보』에 작문과 시가 실릴 정도로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으며, 이화여자전문학교 재학 중이던 1932년 6월 잡지 『신동아』에 「밤의 찬미」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 이밖에도 재학 중에 「고성허(古城墟)에서」(뒤에 滿月臺로 개작) 외 5편을 『이화(梨花)』에, 「제석(除夕)」을 『신가정』에 발표했다.
“시원” 동인.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감수성이 드러난 시로 개성적인 세계를 개척하였다. 고독과 향수가 어우러진 부드럽고 소박한 서정성을 추구했으며, 현실에 초연한 시 세계를 보여 주었다. 시집으로는 “산호림(珊瑚林)”(1938), “창변(窓邊)”(1945), “별을 쳐다보며”(1953), “사슴의 노래”(195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