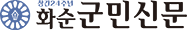상생배려(相生配慮)에 공명지조(共命之鳥)를 거울삼아 인성의 근본을 삼자
작성 : 2020년 02월 05일(수) 09:06 가+가-

이영일 화순문화원장
상생(相生) -. 꽃잎 하나가 시들고 떨어지면 꽃송이 전체가 망가지듯 서로 배려(配慮)하는 공생(共生)의 삶을 뜻한다. 이른바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이다. 남을 위하는 게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이러한 정신의 실천을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이라 합니다. 자익익타(自益益他)․자리리인(自利利人)․자행화타(自行化他)...
일화(逸話)를 봅시다. 드넓은 사막 한 가운데 폐허나 다름없는 주유소가 있고 그곳에 유일하게 물 펌프가 하나 남아있다. 한 지친 나그네가 목마름으로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유소의 물 펌프를 발견했다. 거기엔 한 바가지의 물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보게 된다.
“이 물 펌프 밑에는 엄청난 양의 시원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이 펌프 물로 목을 축이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펌프 앞에 놓은 바가지의 물만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펌프 안에 넣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만 지하의 물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을 축이셨으면 잊지 말고 이 바가지에 다시 한가득 물을 퍼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 또 다른 나그네를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 뒷날의 나그네를 위해 다시 한 바가지의 물을 남겨 놓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자리이타 정신이다. 자신이 또다시 그 샘물을 찾을 수도 있기에 이웃을 위한 배려는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적절하게 나누는 세상이 그립다. 공익적 사회다. 상생 정신의 실천이다.
"남의 재앙을 민망하게 여기고, 이웃의 잘됨을 즐겁게 여기며, 남의 급함을 도와주고, 이웃의 위태로움을 구해주라 (悶人之凶 樂人之善, 濟人之急 救人之危)”는 명심보감 성심편은 공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와 명예를 일부 사람만이 독차지하려 했을 때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공명지조(共命之鳥)’.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내용으로서 상생의 운명공동체를 뜻한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잘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우리의 자화상이다. 세밑이다. 증오와 갈등을 날려 보내고 배려와 공생의 새날을 맞자.
‘공명지조(共命之鳥)’<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과<잡보장경(雜寶藏經)> 등 불교경전에 있는 말이다.
이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으며, 히말라야 기슭인 극락에 산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로 두 생명이 서로 붙어 있어 상생조(相生鳥)ㆍ공생조(共生鳥)ㆍ생생조(生生鳥)라고 한다. 두 머리를 가진 새의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나는 등 일상패턴이 다르다 보니 다투는 일이 잦았다. 한 머리가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데, 다른 머리는 질투심을 갖고 있었다. (시기심에 가득 찬) 머리의 새는 언제고 보복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었다. 결국 독이 온몸에 퍼져 두 머리를 가진 새는 죽게 되었다. 시기심으로 심술부렸다가 상대방은 물론이요 자신까지 함께 죽게 된 것이다. 함께 죽음을 자초한 공멸(共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 그 반대로 상대에게 양보(讓步)ㆍ배려(配慮)했다면 공생(共生)이 되었을 것이다.
앞의 새처럼 현 우리 중생도 이와 유사하다. 살면서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 상대를 시기 질투해서 상대를 해한다면, 결국 자신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연기설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신이 상대를 해하면 그 과보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미친다. 이 점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불교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가 매우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런데 음식을 집을 수는 있는데, 젓가락이 길어 아무리 노력해도 입에 넣지 못했다. 결국 음식을 앞에 두고, 젓가락질이 어려워 배를 곯는다.
그런데 극락[天國]을 표현하는 그림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젓가락이 길어 자기 입에 음식을 넣을 수가 없자, 긴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 입에 음식을 먹여준다. 또 그 상대방도 긴 젓가락으로 자신의 입에 넣어준다. 곧 긴 젓가락으로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니,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밥을 먹는 장면이다. 곧 상대에게 심려(心慮)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배려(配慮)를 하는 것이 극락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 맨 앞에서 거론했던 공명지조((共命之鳥)로 돌아가 내용을 정리해보자. 지옥과 극락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심려ㆍ배려]를 어떤 마음에 머물러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내 시기심 때문에 상대를 해한다면, 그 상대의 고통만큼 자신도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 심려가 아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우리 모두는 상생배려(相生配慮)하고 공명지조(共命之鳥)정신을 거울삼아 밝은 사회를 이룩합시다.
일화(逸話)를 봅시다. 드넓은 사막 한 가운데 폐허나 다름없는 주유소가 있고 그곳에 유일하게 물 펌프가 하나 남아있다. 한 지친 나그네가 목마름으로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유소의 물 펌프를 발견했다. 거기엔 한 바가지의 물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보게 된다.
“이 물 펌프 밑에는 엄청난 양의 시원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이 펌프 물로 목을 축이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펌프 앞에 놓은 바가지의 물만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펌프 안에 넣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만 지하의 물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을 축이셨으면 잊지 말고 이 바가지에 다시 한가득 물을 퍼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올지도 모르는 또 다른 나그네를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 뒷날의 나그네를 위해 다시 한 바가지의 물을 남겨 놓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자리이타 정신이다. 자신이 또다시 그 샘물을 찾을 수도 있기에 이웃을 위한 배려는 곧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재물과 권력, 명예를 적절하게 나누는 세상이 그립다. 공익적 사회다. 상생 정신의 실천이다.
"남의 재앙을 민망하게 여기고, 이웃의 잘됨을 즐겁게 여기며, 남의 급함을 도와주고, 이웃의 위태로움을 구해주라 (悶人之凶 樂人之善, 濟人之急 救人之危)”는 명심보감 성심편은 공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와 명예를 일부 사람만이 독차지하려 했을 때 그 사회는 혼란스러워진다.
‘공명지조(共命之鳥)’.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내용으로서 상생의 운명공동체를 뜻한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잘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우리의 자화상이다. 세밑이다. 증오와 갈등을 날려 보내고 배려와 공생의 새날을 맞자.
‘공명지조(共命之鳥)’<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과<잡보장경(雜寶藏經)> 등 불교경전에 있는 말이다.
이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으며, 히말라야 기슭인 극락에 산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로 두 생명이 서로 붙어 있어 상생조(相生鳥)ㆍ공생조(共生鳥)ㆍ생생조(生生鳥)라고 한다. 두 머리를 가진 새의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나는 등 일상패턴이 다르다 보니 다투는 일이 잦았다. 한 머리가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데, 다른 머리는 질투심을 갖고 있었다. (시기심에 가득 찬) 머리의 새는 언제고 보복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었다. 결국 독이 온몸에 퍼져 두 머리를 가진 새는 죽게 되었다. 시기심으로 심술부렸다가 상대방은 물론이요 자신까지 함께 죽게 된 것이다. 함께 죽음을 자초한 공멸(共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 그 반대로 상대에게 양보(讓步)ㆍ배려(配慮)했다면 공생(共生)이 되었을 것이다.
앞의 새처럼 현 우리 중생도 이와 유사하다. 살면서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 상대를 시기 질투해서 상대를 해한다면, 결국 자신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연기설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신이 상대를 해하면 그 과보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미친다. 이 점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불교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가 매우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런데 음식을 집을 수는 있는데, 젓가락이 길어 아무리 노력해도 입에 넣지 못했다. 결국 음식을 앞에 두고, 젓가락질이 어려워 배를 곯는다.
그런데 극락[天國]을 표현하는 그림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젓가락이 길어 자기 입에 음식을 넣을 수가 없자, 긴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 입에 음식을 먹여준다. 또 그 상대방도 긴 젓가락으로 자신의 입에 넣어준다. 곧 긴 젓가락으로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니,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밥을 먹는 장면이다. 곧 상대에게 심려(心慮)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배려(配慮)를 하는 것이 극락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 맨 앞에서 거론했던 공명지조((共命之鳥)로 돌아가 내용을 정리해보자. 지옥과 극락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심려ㆍ배려]를 어떤 마음에 머물러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내 시기심 때문에 상대를 해한다면, 그 상대의 고통만큼 자신도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 심려가 아닌 배려하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우리 모두는 상생배려(相生配慮)하고 공명지조(共命之鳥)정신을 거울삼아 밝은 사회를 이룩합시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 기사 더보기
Copyright © 2018 화순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