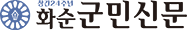전쟁 수기 - 짐승과 거지, 그리고 인간
작성 : 2019년 10월 28일(월) 10:54 가+가-

김중섭 선생
모른다고 했다. 무 하나를 얻어먹고 군인들의 짐을 밀어주며 국군 부대로 갔다.
부대에 들어가 뜻하지 않게 하도야마라고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했던 중동학교 시절의 물리학 선생님을 만났다. 그분은 중위 계급장을 달고 대대 공급관을 하고 계셨다.
“하도야마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중동학교를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자 그때서야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셨다. 대충 사정을 말씀드리고 포로수용소로 넘겨 달라고 부탁했다.
“알았다. 걱정 말고 저기 취사장 옆에 앉아 있어라.”
이제는 살길을 찾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우리 앞을 지나던 군인 몇 사람이 난데없이 미군 군화를 신은 발로 발길질을 했다.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인민군이지?”
이놈도 지나다 차고 저놈도 지나다 찼다. 부뚜막 옆에 쪼그리고 앉은 개를 지나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두들겨 패듯 취사장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우리들을 개 패듯 팼다. 우리는 멍청하게 앉아 때리는 데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공급관을 만나 군인들이 때린다는 말은 못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우선 얻어터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군인들을 따라 민가에 나가 장독을 뒤지며 된장과 간장을 수색했다.
찾아낸 된장과 간장을 드럼통에 넣어 가지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해원이가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대령님, 경기고등학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쫄병 생활을 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군대에서 장교는 군계일학(群鷄一鶴)처럼 빛난다. 내가 주위 계급장을 단 중학교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랬다. 하물며 대령이라니! 하늘과 같이 높아 보였다.
해원이의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이었다. 지옥의 길목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뻤다. 국군 5연대 3대대 대대장이라 했다.
“잘 되었다. 오늘 밤 열두시에 평야에서 서울로 떠나는 트럭이 있다. 그 차를 타고 서울로 가라!”
신이 났다. 들뜬 기분으로 부대에 돌아와 서울 갈 시간만 기다렸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거처하고 있던 부대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갑자기 순천으로 부대가 이동한다며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허, 이거 큰일이다. 우리도 순천으로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우리 네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 쳐다보았다.
그때에 대대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3대대장이 부대 공급관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를 헌병대에 인계하라는 내용이었다.
위기를 넘긴 우리는 공급관과 함께 어느 학교에 주둔하고 있는 헌병대에 가서 그들에게 인수인계되었다. 그때 은사이던 공급관이 수건과 담배를 주었던 것이 두고두고 고마웠다. 이런 어수선한 절차를 밟는 바람에 밤 열두 시에 서울로 간다던 차를 타지 못하고 그날 밤은 헌병대가 있는 교실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양면 괘지에 신분증명서를 써 주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다. 평양에서 사리원을 거쳐 서울까지 통과시켜라. 평양전투지구 헌병사령관.”
전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분증이었다. 이 정도의 신분증이면 서울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부러진 다리가 이어진 것과 같이 통쾌한 기분으로 의기양양하게 아침 열시쯤에 헌병대를 나와 대동강으로 갔다.
강을 건널 걱정이 태산 같았다. 강변에서 나이 드신 영감님 한분을 만났다. 돈이 없어 증명서만 내보이고 사정을 했다. 흔쾌하게 배를 태워 주셔서 무난하게 대동강을 건넜다.
대동강 강변에는 열일곱, 여덟 살 정도 먹은 유엔군들이 M-1소총을 들고 100미터 간격으로 강을 지키고 있었다.
사리원 방면의 도로를 택하여 15리쯤 걸었다. 보초를 서던 군인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검문했다.
“너희들, 인민군이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인민군이라니! 내가 가지고 있던 헌병사령관의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그 친구는 총을 들었지만 글자를 모르는 군인이었다.
“이게 뭐꼬?”
증명서를 받아 쥔 그 군인은 경상남도 동래나 울산 금방의 말투로 물었다.
헌병 사령관이 신원을 보증한 증명서라고 설명했다. 글자를 모르는 군인이 내 말을 믿을 리가 없었다.
“이런 인민군 같은 간은 새끼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순간 귀중한 증명서를 그 무식한 군인이 쫙쫙 찢어버리고 담배를 빼앗고 내가 차고 있던 성균관대학 허리띠 버클까지 빼앗더니, 1 열 종대로 손을 들고 서라고 했다.
“앞으로 갓!”
뒤에서 총을 대고 앞으로 가라고 윽박질렀다. 기가 막힌 순간이었다. 이제 증명서까지 없어진 우리는 어디로 또 끌려가는 것일까?
무식한 녀석이 귀중한 신분증명서까지 찢어버리고 M-1 총을 등 뒤에 대고 무조건 앞으로 가라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는 것일까?
끌려간 곳은 미군 부대였다. 우리보다 먼저 끌려온 오,육십대의 남자 3, 4명과 여자 2명,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이 있었다. 영어는 제대로 하지 못하나 아는 단어들을 꿰어 맞추어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미군들은 무조건 “NO” 소리만 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열두 시가 되었다. “안남미”로 지은 밥을 점심으로 주었다. 안남미란 버마 지방에서 생산한 쌀로 쌀알이 작고 푹신푹신하며 장기간 보관하여 오래된 쌀 특유의 냄새가 난다. 평시 같으면 한 숟가락도 먹을 기분이 나지 않겠지만, 그때는 그것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 살 것만 같았다.
저녁때가 되었다. 미군들이 군용차에 태워 다시 대동강에 걸쳐있는 부교를 건너 평양으로 끌고 갔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으나 앉고 보니 포로수용소였고 건물은 평양교화소 건물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라 검둥이 군인들이 판초를 입고 또 어디론가 끌고 갔다. 어느 건물 1층에 도착했다.
“들어가”
웬 사람이 이렇게도 많을까? 아마 칠, 팔백여 명은 될 법했다. 우리가 쳐박힌 건물은 인민군들의 “민복”을 만들던 곳이었다. 민복이란 겉은 국방색이고 속은 흰색으로 평상시에는 국방색 쪽을 입고 눈이 오면 흰색 쪽으로 뒤집어 입는 솜을 넣어 누빈 옷이다.
솜이 지천이었다. 바닥은 시멘트 날바닥이라 차고 냉기가 올랐다. 사람마다 솜덩이를 깔고 덮고 안고 잠이 들었다. 밤 열한 시쯤 되었을까?
“불이야!”
깜깜한 밤중에 건물 안은 이 난데없는 외마디 소리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피운 담뱃불이 솜에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아닌 밤중에 난리가 나자 2층과 3층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불길을 뚫고 아우성치며 아래층으로 다투어 내려왔다.
보이는 것이 없었다. 힘이 약해 넘어져 있는 여자를 비롯하여 십여 명이 현장에서 깔려 죽었다.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나는 다행히 1층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아비규환의 수라장에서 나오는데로 군인들은 수용인들을 다시 군용 트럭에 실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 서울까지 가자던 우리들은 이 와중에서 헤어지고 말았다.
이동한 곳은 굉장히 넓은 곳이었다. 누군가가 평양 방직공장이라 했다. 견고한 바닥에 함석으로 지붕을 입힌 건물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컸고, 그런 건물이 20여 동이나 있었다. 전기 트란스는 서넛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할 만큼 켰고, 그런 트란스가 한 동에 10여 개씩 있었다.
이튿날 아침, 100명씩 조를 짜서 “소대”를 구성했다. 나는 소대장에 지명이 되었고, 이어서 영어를 아는 사람으로 차출되어 부대 본부로 갔다.
부대에 들어가 뜻하지 않게 하도야마라고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했던 중동학교 시절의 물리학 선생님을 만났다. 그분은 중위 계급장을 달고 대대 공급관을 하고 계셨다.
“하도야마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중동학교를 다녔다는 말씀을 드리자 그때서야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셨다. 대충 사정을 말씀드리고 포로수용소로 넘겨 달라고 부탁했다.
“알았다. 걱정 말고 저기 취사장 옆에 앉아 있어라.”
이제는 살길을 찾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우리 앞을 지나던 군인 몇 사람이 난데없이 미군 군화를 신은 발로 발길질을 했다.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인민군이지?”
이놈도 지나다 차고 저놈도 지나다 찼다. 부뚜막 옆에 쪼그리고 앉은 개를 지나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두들겨 패듯 취사장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우리들을 개 패듯 팼다. 우리는 멍청하게 앉아 때리는 데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공급관을 만나 군인들이 때린다는 말은 못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우선 얻어터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군인들을 따라 민가에 나가 장독을 뒤지며 된장과 간장을 수색했다.
찾아낸 된장과 간장을 드럼통에 넣어 가지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해원이가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대령님, 경기고등학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쫄병 생활을 해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군대에서 장교는 군계일학(群鷄一鶴)처럼 빛난다. 내가 주위 계급장을 단 중학교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랬다. 하물며 대령이라니! 하늘과 같이 높아 보였다.
해원이의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이었다. 지옥의 길목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기뻤다. 국군 5연대 3대대 대대장이라 했다.
“잘 되었다. 오늘 밤 열두시에 평야에서 서울로 떠나는 트럭이 있다. 그 차를 타고 서울로 가라!”
신이 났다. 들뜬 기분으로 부대에 돌아와 서울 갈 시간만 기다렸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거처하고 있던 부대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갑자기 순천으로 부대가 이동한다며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허, 이거 큰일이다. 우리도 순천으로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우리 네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 쳐다보았다.
그때에 대대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3대대장이 부대 공급관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를 헌병대에 인계하라는 내용이었다.
위기를 넘긴 우리는 공급관과 함께 어느 학교에 주둔하고 있는 헌병대에 가서 그들에게 인수인계되었다. 그때 은사이던 공급관이 수건과 담배를 주었던 것이 두고두고 고마웠다. 이런 어수선한 절차를 밟는 바람에 밤 열두 시에 서울로 간다던 차를 타지 못하고 그날 밤은 헌병대가 있는 교실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양면 괘지에 신분증명서를 써 주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다. 평양에서 사리원을 거쳐 서울까지 통과시켜라. 평양전투지구 헌병사령관.”
전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분증이었다. 이 정도의 신분증이면 서울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부러진 다리가 이어진 것과 같이 통쾌한 기분으로 의기양양하게 아침 열시쯤에 헌병대를 나와 대동강으로 갔다.
강을 건널 걱정이 태산 같았다. 강변에서 나이 드신 영감님 한분을 만났다. 돈이 없어 증명서만 내보이고 사정을 했다. 흔쾌하게 배를 태워 주셔서 무난하게 대동강을 건넜다.
대동강 강변에는 열일곱, 여덟 살 정도 먹은 유엔군들이 M-1소총을 들고 100미터 간격으로 강을 지키고 있었다.
사리원 방면의 도로를 택하여 15리쯤 걸었다. 보초를 서던 군인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검문했다.
“너희들, 인민군이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인민군이라니! 내가 가지고 있던 헌병사령관의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그 친구는 총을 들었지만 글자를 모르는 군인이었다.
“이게 뭐꼬?”
증명서를 받아 쥔 그 군인은 경상남도 동래나 울산 금방의 말투로 물었다.
헌병 사령관이 신원을 보증한 증명서라고 설명했다. 글자를 모르는 군인이 내 말을 믿을 리가 없었다.
“이런 인민군 같은 간은 새끼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순간 귀중한 증명서를 그 무식한 군인이 쫙쫙 찢어버리고 담배를 빼앗고 내가 차고 있던 성균관대학 허리띠 버클까지 빼앗더니, 1 열 종대로 손을 들고 서라고 했다.
“앞으로 갓!”
뒤에서 총을 대고 앞으로 가라고 윽박질렀다. 기가 막힌 순간이었다. 이제 증명서까지 없어진 우리는 어디로 또 끌려가는 것일까?
무식한 녀석이 귀중한 신분증명서까지 찢어버리고 M-1 총을 등 뒤에 대고 무조건 앞으로 가라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는 것일까?
끌려간 곳은 미군 부대였다. 우리보다 먼저 끌려온 오,육십대의 남자 3, 4명과 여자 2명,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이 있었다. 영어는 제대로 하지 못하나 아는 단어들을 꿰어 맞추어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미군들은 무조건 “NO” 소리만 지르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열두 시가 되었다. “안남미”로 지은 밥을 점심으로 주었다. 안남미란 버마 지방에서 생산한 쌀로 쌀알이 작고 푹신푹신하며 장기간 보관하여 오래된 쌀 특유의 냄새가 난다. 평시 같으면 한 숟가락도 먹을 기분이 나지 않겠지만, 그때는 그것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 살 것만 같았다.
저녁때가 되었다. 미군들이 군용차에 태워 다시 대동강에 걸쳐있는 부교를 건너 평양으로 끌고 갔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처음에는 어딘지 몰랐으나 앉고 보니 포로수용소였고 건물은 평양교화소 건물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라 검둥이 군인들이 판초를 입고 또 어디론가 끌고 갔다. 어느 건물 1층에 도착했다.
“들어가”
웬 사람이 이렇게도 많을까? 아마 칠, 팔백여 명은 될 법했다. 우리가 쳐박힌 건물은 인민군들의 “민복”을 만들던 곳이었다. 민복이란 겉은 국방색이고 속은 흰색으로 평상시에는 국방색 쪽을 입고 눈이 오면 흰색 쪽으로 뒤집어 입는 솜을 넣어 누빈 옷이다.
솜이 지천이었다. 바닥은 시멘트 날바닥이라 차고 냉기가 올랐다. 사람마다 솜덩이를 깔고 덮고 안고 잠이 들었다. 밤 열한 시쯤 되었을까?
“불이야!”
깜깜한 밤중에 건물 안은 이 난데없는 외마디 소리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피운 담뱃불이 솜에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아닌 밤중에 난리가 나자 2층과 3층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불길을 뚫고 아우성치며 아래층으로 다투어 내려왔다.
보이는 것이 없었다. 힘이 약해 넘어져 있는 여자를 비롯하여 십여 명이 현장에서 깔려 죽었다.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나는 다행히 1층에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 아비규환의 수라장에서 나오는데로 군인들은 수용인들을 다시 군용 트럭에 실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 서울까지 가자던 우리들은 이 와중에서 헤어지고 말았다.
이동한 곳은 굉장히 넓은 곳이었다. 누군가가 평양 방직공장이라 했다. 견고한 바닥에 함석으로 지붕을 입힌 건물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컸고, 그런 건물이 20여 동이나 있었다. 전기 트란스는 서넛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할 만큼 켰고, 그런 트란스가 한 동에 10여 개씩 있었다.
이튿날 아침, 100명씩 조를 짜서 “소대”를 구성했다. 나는 소대장에 지명이 되었고, 이어서 영어를 아는 사람으로 차출되어 부대 본부로 갔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 기사 더보기
Copyright © 2018 화순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