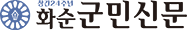사람이 개만 못해서야
양기정 한국고전번역원 책임연구원
작성 : 2018년 05월 09일(수) 11:02 가+가-
-
의로운 개가 목숨을 바친 곳
발길을 멈추고서 비석을 보네
술 취해 잠든 주인 깨지를 않아
바람에 불이 번져 태우려 하자
주인의 목숨 구해 온전케 하니
공을 바래 목숨을 바친 것이랴
세상에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
이 무덤을 본다면 부끄럽겠지
義狗捐生地
停鞭覽碣文
醉眠人不起
風猛火將焚
救主由全性
殉身豈要勳
草間偸活輩
寧不愧斯墳
- 홍직필(洪直弼, 1776~1852)
『매산집(梅山集)』 권1
「선산 의구총을 지나며[過善山義狗塚]」
이 시는 조선 후기의 학자 홍직필(洪直弼)이 선산(善山)의 의구총(義狗冢) 옆을 지나다가 감회가 있어 지은 시이다. 지금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에 무덤과 ‘의구총’이라고 쓰인 비석이 남아 있고, 무덤 뒤로는 당시의 일을 그림으로 새긴 석판(石版)이 둘러쳐 있다. 의로운 개의 일화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웠는데, 개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서 주인이 누운 자리까지 번져왔다. 개가 짖으며 주인의 옷을 끌었으나 주인은 끝내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개가 강으로 달려가 자신의 몸을 적셔 와서는 몸을 흔들어 사방의 풀을 적셨다. 불이 꺼질 때까지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탈진하여 죽고 말았다. 개 덕분에 죽음을 면한 주인은 깨어나 곁에 죽어 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고이 묻고 봉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에도 전한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린아이 때 부모를 대하던 태도와 부쩍 달라진다. 그들에게 한없이 큰 자리를 차지하던 부모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이성, 친구, 음악, 게임 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다. 맹자(孟子)는 “어려서는 부모를 사랑하다가도, 이성 좋은 줄 알게 되면 예쁜 여자(멋진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人少則慕父母,知好色則慕少艾]”라고 하지 않았던가! 자연의 이치가 그러한 것이니,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퇴근해 들어오는 나를 반기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두 마리 강아지이다. 기뻐서 꼬리를 흔들며 서로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팔짝팔짝 뛰는 모양을 보며 흐뭇해하다 보면 세상 근심이 잠시나마 잊히고,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서로 간에 더 잘 소통해보자는 목적으로 SNS가 발전하였지만, 현대인들은 오히려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다. 서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버 세계이다 보니, 얼굴을 마주할 때 생기는 인간적인 정이나 유대가 쌓이기 더욱 어려워졌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정서적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리라. 그런데 요즘 늘어나는 한편으로 버려지거나 길을 잃는 반려동물도 많아졌다.
집 근처 공원으로 통하는 광장에는 토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천막을 임시로 설치하여 유기견들을 모아둔다.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입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안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 가끔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개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면, 애잔한 그 눈빛을 형언하기 어렵다. 우리 집 개들도 여기서 입양했지만, 키울수록 새끼 때부터 키우던 개들 못지 않게 애정이 간다. 입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든다.
개는 의리의 친구이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인의 곁을 지켜주고,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목숨을 바쳐 도와준다. 주위에 이만한 친구가 있는가? 하지만 인간은 자기 필요에 의해 키우다가 필요성이 줄거나,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늙거나 하게 되면 그 의리의 친구를 버린다. 주인이 버리고 떠난 자리를 지키며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는 반려견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개들은 주인을 위해 죽기도 하는데, 사람이 개만 못해서야 되겠는가.
의로운 개가 목숨을 바친 곳
발길을 멈추고서 비석을 보네
술 취해 잠든 주인 깨지를 않아
바람에 불이 번져 태우려 하자
주인의 목숨 구해 온전케 하니
공을 바래 목숨을 바친 것이랴
세상에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
이 무덤을 본다면 부끄럽겠지
義狗捐生地
停鞭覽碣文
醉眠人不起
風猛火將焚
救主由全性
殉身豈要勳
草間偸活輩
寧不愧斯墳
- 홍직필(洪直弼, 1776~1852)
『매산집(梅山集)』 권1
「선산 의구총을 지나며[過善山義狗塚]」
이 시는 조선 후기의 학자 홍직필(洪直弼)이 선산(善山)의 의구총(義狗冢) 옆을 지나다가 감회가 있어 지은 시이다. 지금도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에 무덤과 ‘의구총’이라고 쓰인 비석이 남아 있고, 무덤 뒤로는 당시의 일을 그림으로 새긴 석판(石版)이 둘러쳐 있다. 의로운 개의 일화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웠는데, 개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서 주인이 누운 자리까지 번져왔다. 개가 짖으며 주인의 옷을 끌었으나 주인은 끝내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개가 강으로 달려가 자신의 몸을 적셔 와서는 몸을 흔들어 사방의 풀을 적셨다. 불이 꺼질 때까지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탈진하여 죽고 말았다. 개 덕분에 죽음을 면한 주인은 깨어나 곁에 죽어 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고이 묻고 봉분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에도 전한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린아이 때 부모를 대하던 태도와 부쩍 달라진다. 그들에게 한없이 큰 자리를 차지하던 부모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이성, 친구, 음악, 게임 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다. 맹자(孟子)는 “어려서는 부모를 사랑하다가도, 이성 좋은 줄 알게 되면 예쁜 여자(멋진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人少則慕父母,知好色則慕少艾]”라고 하지 않았던가! 자연의 이치가 그러한 것이니,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퇴근해 들어오는 나를 반기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두 마리 강아지이다. 기뻐서 꼬리를 흔들며 서로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팔짝팔짝 뛰는 모양을 보며 흐뭇해하다 보면 세상 근심이 잠시나마 잊히고,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서로 간에 더 잘 소통해보자는 목적으로 SNS가 발전하였지만, 현대인들은 오히려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다. 서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이버 세계이다 보니, 얼굴을 마주할 때 생기는 인간적인 정이나 유대가 쌓이기 더욱 어려워졌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정서적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리라. 그런데 요즘 늘어나는 한편으로 버려지거나 길을 잃는 반려동물도 많아졌다.
집 근처 공원으로 통하는 광장에는 토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천막을 임시로 설치하여 유기견들을 모아둔다.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입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정 기간 안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 가끔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개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면, 애잔한 그 눈빛을 형언하기 어렵다. 우리 집 개들도 여기서 입양했지만, 키울수록 새끼 때부터 키우던 개들 못지 않게 애정이 간다. 입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든다.
개는 의리의 친구이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주인의 곁을 지켜주고,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목숨을 바쳐 도와준다. 주위에 이만한 친구가 있는가? 하지만 인간은 자기 필요에 의해 키우다가 필요성이 줄거나,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늙거나 하게 되면 그 의리의 친구를 버린다. 주인이 버리고 떠난 자리를 지키며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는 반려견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개들은 주인을 위해 죽기도 하는데, 사람이 개만 못해서야 되겠는가.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 기사 더보기
Copyright © 2018 화순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rd.